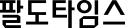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과연 어느 시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는. 대부분 학창시절에 배운 상식적인 수준의 ‘앎’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특정 시인의 삶을 하나의 세계로 정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장르의 특성상 시는 폭이 넓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시인을 아니 특정 예술가의 작품 세계를 단적으로 규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 자신이 만든 틀 속에 예술가를 가두려는 경향이 있다.
신석정(1907~1974) 시인의 경우가 그러한 예다. 대부분 그를 목가 시인, 전원 시인이라고 부른다. 석정을 전원 시인으로 한정하는 이들은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등의 작품만을 대표작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그의 삶 전체와 시 세계 전반을 아우르다 보면 ‘목가’(牧歌)라는 인식의 틀로는 범주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을 알게 된다. 석정을 시대정신을 대변한 ‘저항시인’ ‘민족시인’으로 보는 이들은, 그의 작품 속에 깃든 도저한 역사의식과 결연한 자유의지를 읽어낸다.
신석정은 일제 강점기, 해방의 격동기, 6·25와 4·19라는 현대사의 질곡을 거치며 독특한 문학적 세계를 일궜다.
부안을 찾은 날은 햇볕이 비추는 날이었다. 부안에 갈 때면 늘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왜 아름다운 곳은 늘 상처와 상흔이 남아 있어야 하는가 라는.
채석강으로 상징되는 변산반도는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다. 조선의 뛰어난 여류 문인 매창은 변산반도를 유람하며 뛰어난 시문을 남겼지만,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던 비련의 주인공이었다. 매창의 시를 읽을 때면 봉건 사회에서 가녀린 여성이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와 애절한 사연이 눈에 밟혀 상념에 젖게 된다.
언급했다시피 부안에는 시인 매창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신석정 시인이 있다. 석정이라는 이름에 맞게 그의 시는 운치가 있고,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아우라가 투영돼 있다. 부안의 승경(勝景)이 그의 작품 속에 깃들어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석정문학관 위로 환한 햇볕이 들이친다. 맑은 바람과 차가운 햇볕이 문학관 주위를 감싼다. 모던하면서도 아름다운 건물은 한 번 보고 나면 오래도록 각인될 만큼 인상적이다. 문학 작품이 작가를 닮는다는 말이 고전적 명언이라면, 이제 그 말은 문학관은 작가의 이미지를 품는다는 말로도 전이될 것 같다.
석정문학관은 지난 2011년 10월 29일 개관했다. 시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시인의 고결한 인품과 시 세계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건립됐다. 1층은 두 개의 전시실로 구성돼 있는데, 상설전시장과 기획전시실로 나뉘어 있다. 유품과 원고, 저서는 상설 전시장에 전시돼 있고 지인들의 편지나 액자 등의 자료는 기획전시실에 비치돼 있다. 기증자료가 비치된 공간과 수장고, 학예연구실은 다방면에서 석정의 면모를 가늠하게 한다.
무엇보다 외지인의 눈길을 끄는 것은 문학관 앞에 자리한 시인의 고택이다. 석정이 26세 되던 해 낙향해 지은 고택인 ‘청구원(靑丘園)’이 손짓을 한다.
바로 이곳에서 석정의 명시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등이 창작됐다. 신석정(辛夕汀) 시인의 원래 본명은 신석정(辛錫正)이다. 동음이의어로 동일하게 부르지만 뜻이 다르다. 일설에는 생일이 음력 7월 7일 칠석(七夕)과 무관치 않다고 한다. ‘저녁 석(夕)’자를 빌어 와 호를 석정(夕汀)이라 했다는 것이다. ‘夕汀’이 ‘錫正’보다 훨씬 시적이고 운치가 있는 것은 석양 무렵에 강물 위로 흐르는 노을이 지는 쓸쓸한 아름다움 때문일 것이다. 강물을 따라 하염없이 흘러가는 석양의 빛은 애상과 초월의 이미지를 넘어 궁극의 세계로 향하는 지고한 뜻을 생각하게 한다.
석정은 1907년 7월 7일(음력)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에서 부친인 신기온과 모친 이윤옥 사이에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고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가풍 속에서 자랐다. 조부인 신제하 씨는 시인이면서 한학자로 알려져 있다. 석정은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처음으로 당시(唐詩)를 접했다. 부친 또한 신학문보다는 한학의 공부를 권유할 만큼 고전적인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다.
모친 또한 사리가 분명한 엄한 분이었다고 전해진다. 석정이 가난한 시인으로 평생을 올곧게 살았던 것은 유년 시절의 가풍과 부모의 교육에서 기인했다. 석정과 관련한 일화 가운데 성정을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석정이 보통학교 다닐 때였던 모양이다. 동료 학생 하나가 수업료를 미납했었다. 일본 담임이 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다 벗겨 수모를 당하게 했다. 의로움이 남달랐던 석정은 전교생을 규합해 시위를 벌였다. 그로 인해 석정은 무기정학을 받았고 이듬해 겨우 복교를 해 졸업을 하기에 이른다.
“대화도 앗아간 가슴에/ 채곡채곡 쌓이는/ 잃어버린 새벽의 찌꺼길 안고/ 무딜 대로 무딘 혓바닥을 깨물면서/ 우리들은/ 역시 어둔 벌판에서 불어대는/ 잔인한 늑대떼의/ 잔인한 울음소릴/ 듣고 있었다.”(‘오한(惡寒)’, 유고시집 ‘내 노래하고 싶은 것은’)
위의 시는 신석정이 박정희 정권의 유신을 전후해 쓴 시다. 날카로운 저항 의식이 느껴진다. 당대의 억압과 폭압을 뚫고 나가려는 몸부림은 준엄하면서도 치열하다.
평론가인 이보영 전북대 명예교수는 ‘신석정 문학의 재평가’(‘석정문학’20집, 2007)에서 이렇게 평한다. 그의 주장은 왜 석정을 자연 서정을 노래한 목가 시인으로 묶어두어서는 안 되는지 명징하게 드러낸다.
“‘비만한 어둠’에 의해 쫓겨난 공명정대한 사회를 지향하는 ‘빛의 아들들’의 이상(‘엉뚱하게 높은 언덕’)은 고귀하기 때문에 그는 압살당하고도 역설적으로 살아서 그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오한’도 역설적으로 ‘자랑하면서’ 견뎌내며. 그의 인도주의 정신은 인류적 공감을 얻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는 것이다. 이중(二重)의 역설에 의하여 고도로 지적(知的) 감동을 유발하는 탁월한 작품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사진=석정문학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