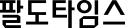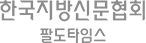|
거침없는 산세에 넋을 잃고 '울산바위' 병풍 삼은 초가집은 어찌나 정겨운지…쉼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누른다
고즈넉한 시골마을의 풍경 너머 명산(名山) 설악산의 풍광이 병풍처럼 펼쳐진다.(사진 ①) 1960년대 말. 어딘가 취재를 가던 강원일보 기자는 차창 밖에 휘리릭하고 등장한 거침없는 설악의 산세(山勢)에 그만 넋을 잃어 차를 세우고 만다. 그리고는 이내 카메라 꺼내 들고는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다. 이런 로또 같은 풍경을 만났으니 필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을 게다. 함께 인화된 다른 사진들로 추측해 보건대, 이 사진을 찍은 기자는 아마도 신흥사로 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멋스러운 소나무들 호위병처럼 내세우고 낭만 가득 태운 시골버스 한 대가 덜컹덜컹, 종착지로 내달린다 취재에서 한발짝 물러나 잠시의 휴식을 결정한 기자의 결단(?)에 50여년이 흐른 뒤 우리는 또 그림같이 아름다운 장면 하나를 만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레트로(retro) 감성 그 자체다. 사진을 한번 톺아보자. 그러고 보니 사진 중심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지점에 검게 그늘져 있는 바위산이 보인다. 바로 `울산바위'다. 이곳이 설악산임을 알리는 랜드마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 `울산바위'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내려온다. 조물주가 아름다운 경승(景勝)을 만들고 싶어 전국의 아름다운 금강산으로 불러 모아 심사를 했다. 그런데 원래 경상도 울산 땅에 있던 울산바위는 제 시간에 도착을 못했고, 결국 금강산 1만2,000봉이 모두 완성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실망한 울산바위는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정착할 곳을 물색하던 중 현재의 자리에 눌러앉게 됐다고 한다. 이런 `산이동설화(山移動說話)'가 생겨 난 것을 보면, 주변의 모습과는 전혀 관계 없이 특이하게 불쑥 솟아오른 바위산의 모습이 그 옛날에도 상당히 특이했던 풍경이었던 모양이다. 재미있는 설화가 하나 더 있다. 울산바위가 설악산에 자리를 잡았다는 소식을 들은 울산부사는 그 길로 신흥사를 찾아가 땅세를 내놓으라고 어깃장을 놨다. 신흥사 주지 스님은 어쩔 수 없이 매년 세금을 물게 됐는데, 어느 해 신흥사의 한 동자승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며 울산부사에게 바위를 도로 울산으로 가져가라고 했다. 울산부사는 “재로 꼰 새끼로 바위를 묶어주면 가져가겠다”는 말로 세금을 계속 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동자승은 풀로 새끼를 꼬아 울산바위를 동여맨 뒤, 이를 불로 태웠고 그 모양새는 울산부사가 말한 그대로였다. 울산부사는 울산바위를 다시 가져가지도 못했고, 당연히 더 이상 세금도 받아내지 못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해 속초의 지명이 한자로 묶을 `속(束)'과 풀 `초(草)' 자를 썼다는 이야기도 있다. 산줄기 아래의 마을의 집들은 조금씩의 사이를 두고 듬성듬성 들어서 있고 전신주가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는 것으로 보아 전기 이용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을 앞의 논이 다 갈아 엎어져 있어 겨울을 지나 봄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눈호강을 마친 기자는 발걸음을 재촉한다. 멋스러운 소나무들을 호위병처럼 세운 도로 한가운데를 설악산을 종착지로 한 버스 한 대가 내달리고 있다.(사진 ②) 아마도 이 버스는 신흥사 그리고 흔들바위, 계조암, 울산바위로 가려는 사람들을 한 차 가득 태워다 주고 오는 길로 보인다. 예나 지금이나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였으니 지금의 북적임이 그때도 당연히 가득했을 것이다. 마치 데칼코마니 처럼 닮아 있는 웅장한 산들이 신흥사 가는 길 옆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산속으로 난 도로를 타고 신흥사에 도착한 강원일보 기자들은 그 많은 인파 속을 헤치며 산에 올랐을 게다. 김남덕·오석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