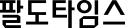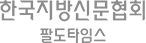인제 북면~양양 서면 잇는
옛부터 교통요지 역할 톡톡
굽이굽이 정상 부근 오르면
설악산 줄기 웅장한 산세에
반해버린 승용차 행렬 가득
“저 산은 내게 우지 마라, 우지 마라 하고/ 발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중/ 저 산은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아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양희은이 부른 한계령이다. 홍천 출신인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가 양양 출신 정덕수 시인의 시(한계령에서 1)를 노랫말에 맞게 개작하고 곡을 붙여 완성한 노래다. 이 노래는 슬픈 선율과 가사, 양희은의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명곡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곡은 한계령 아래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바닷가 마을에서 자란 하덕규가 극한의 상황, 절박한 심정에 한계령을 찾았다가 '우지 마라', '내려가라'는 한계령의 외침을 듣고 만들어낸 곡이라고 한다.
마침 평범한 소시민들의 고단한 삶을 담은 양귀자의 소설 '한계령'도 있어서인지 한계령이 주는 느낌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사색적이다. 이처럼 문학적인 표현들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 분명 독특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아마도 고개를 넘을 때 만나게 되는 짙은 안개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 아닐까 생각된다.
한계령은 인제군 북면과 양양군 서면을 잇는 고개다. 1981년 8월 한계령 도로포장공사(사진 ②) 준공식이 열렸고, 그해 12월 공사가 완공되면서 인제와 양양 간 고갯길을 왕복 2차로(44번 국도)로 통행할 수 있게 됐다. 이곳은 옛날에는 '소동라령(所冬羅嶺)'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동해안과 내륙을 잇는 교통요지 역할을 톡톡히 해낸 곳이다. 현재도 설악산 등산객과 오색약수를 방문는 관광객들이 꾸준히 애용하는 길이다.
한계령은 1981년 도로포장공사 이전인 1972년 군(軍)에 의해 먼저 개통됐었다. 3군단 소속 군인들이 고갯길 공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군단장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었다. 그래서 한계령휴게소 뒤편 계단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김재규의 시를 새긴 설악루 시비와 위령비 등 당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름 등을 훼손해 놓았다.
차를 타고 한계령 정상에 다다르면 아름다운 건물을 만나게 된다. 바로 한계령휴게소다. 1982년 한국건축가협회 대상을 수상한 이곳은 휴게소로는 보기 드물게 '작품'이라고 불릴 만한 건물이다. 미국의 타임지가 '한국의 가장 경탄할 만한 훌륭한 건축가'라고 평한 김수근(1931~1986년)씨가 설계했기 때문이다. '김수근 건축론'에 따르면 “'한계령휴게소'는 한계령의 정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지형을 변형시키지 않으면서 건물이 자연스럽게 대지에 삽입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계령휴게소가 들어서기 전부터 한계령 정상 부근(사진 ①)은 절경 촬영스팟인 것을 일찌감치 알아본 사람들의 승용차와 버스 행렬이 그득했다. 내리막 너머 양양 쪽으로 설악산 줄기의 웅장한 산세가 눈길을 사로잡기 충분해 보인다. 주차장 공간처럼 조성은 해 놓았지만 그 끝이 안전펜스 하나 없는 낭떠러지여서 위태로워 보인다. 한때 한계령과 오색령 명칭을 두고 인제군과 양양군의 다툼이 있어서인지 한계령 정상에 가면 '한계령휴게소'와 '백두대간 오색령' 표지석을 동시에 볼 수 있다.
김남덕·오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