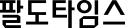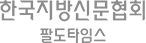조선 후기의 무신인 류림 장군
청 태종마저 최고의 장수 인정
철원군 김화읍 충렬사에 배향
평안도병마절도사 류림 대첩비
'영농한계선' 큼지막하게 표시
6·25전쟁 당시 피탄 흔적 수모
수많은 시인·묵객이 노래하던 철원 한탄강의 절경이 원형(原型)을 잃어 가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UNESCO Global Geopark)에 등재될 만큼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한탄강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치와 아름다움으로 인해 예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변하고 있다. 또 철원의 역사 속 인물인 조선시대 명장 충장공 류림(1581~1643년)의 무훈을 기리는 전적비는 그 내용의 중요성과 달리 현대의 표지석처럼 오용되면서 역사적 의미를 점차 잃어 가고 있다.
■실경산수화가 된 한탄강=조선의 산수화는 높은 성취도를 자랑하기도 하지만 대자연을 대상으로 해 선조들의 자연관, 철학, 사상을 담아내고 있다. 이 중 겸재(謙齋) 정선(鄭敾·1676∼1759년)은 실경산수화를 개척한 화가다. 우리 산수를 특유의 필체로 그려낸 천재 작가로, 그의 손에서 조선 산수는 다시 태어났다. 중국과는 다른 친근한 우리의 산천을 그린 산수화는 화단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100년간 '겸재풍'의 유행을 만들어 낸다. 하지만 이런 그의 재능은 혼자만 이룬 것이 아니다. 당시 최고 권력 집안인 안동 김씨 가운데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1570~1652년)의 후원이 있어 가능했다.
조선을 대표하는 화가, 겸재 정선은 철원 한탄강 그림을 4점 남길 정도로 철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는 겸재의 스승인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1653~1722년)이 철원에 은거해 있던 영향이 컸다. 화적연(포천), 삼부연폭포, 정자연, 화강백전 등 철원 한탄강 경치가 그림으로 남겨진 이유다. 어쩌면 올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승인된 한탄강의 가치를 과거 선조들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렇게 문화유산으로 남은 한탄강이 현재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상절리가 가장 아름다운 구간인 송대소 구간에 대형 다리가 만들어졌다. 자연미가 뛰어나 겨울철 얼음 트레킹 축제가 열리는 이곳에 수많은 사람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문명의 손길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남측에 남은 평안도절제사=분단의 상처는 문화재에도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병자호란을 증언하고 있는 '평안도병마절도사 류림 대첩비'다. 이 대첩비는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에 있으며 병자호란 당시 대승을 거둔 조선 후기 무신 류림의 무훈을 기리는 비이지만 6·25전쟁 당시의 총탄 자국도 남아 있고 각종 암각으로 수난을 겪고 있다.
이 대첩비의 배경이 되는 것은 병자호란 당시 용인 광교산 전투와 함께 조선군이 승리를 거둔 전투다.
김상헌의 결사항전의 의지를 전쟁에서 풀어낸 이 전투는 겸재 정선의 '화강백전(花江栢田)'이란 그림으로 탄생하게 된다. 여기서 '화강'은 한탄강 지류로 생창리 마을 앞을 흐르는 강이다. '백전'은 철원군 김화읍에서 남쪽으로 2리쯤 떨어진 곳으로 과거 조선군과 청군의 싸움이 있었던 곳이다.
평지에 진을 친 평안감사 홍명구는 2,000명의 병사와 함께 청군에게 패해 전사했지만 군인이었던 평안도 병마절도사 류림(柳琳)의 군대는 잣나무 숲 언덕에 진을 쳐서 적을 물리쳤다. 그래서 '화강백전'은 충장공 류림을 추모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류림은 당시 조선에게 큰 시련을 안긴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온몸으로 맞대며 살아온 풍운아다. 10여세에 임진왜란 중 형제와 부모를 잃은 그는 고아로 자라 무과에 급제해 무인의 길을 걸었다. 김화전투에서 승리한 후 청군에 항복한 인조의 명령에 따라 안주병영으로 달려가 청군을 도와 명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당시 청 태종은 류림을 조선 제일 장수로 인정해 좌의정으로 추정됐으며 충장공이란 시호도 내렸다.
겸재의 그림은 이런 특징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을 그림 안에 녹여냈다. '백전'은 잣나무 밭을 의미한다. 사계절 푸르른 잣나무는 변하지 않은 절개를 표현한다. 빽빽이 들어선 잣나무들은 우국충절에 나선 조선의 병사다. 이 그림을 본 겸재의 스승 삼연은 조상님을 뵌 듯 그림을 보고 시를 지었다.
하지만 이렇듯 공이 많은 류림이지만, 정작 그의 사당은 없다. 대신 철원군 김화읍에 위치한 홍명구의 사당인 충렬사에 함께 배향(配享·공신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일)됐다. 충렬공 홍명구는 류림보다 15살 아래로 김화 백전전투에서 전사한 후 이조판서로 추증됐다. 이후 손자 홍득기가 효종의 부마가 되면서 김화전투에서 홍명구의 공이 부풀려지고 상대적으로 류림은 깎이게 됐다. 이 같은 사유로 충장공 류림을 기리는 충장사는 사라지고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충렬사에 더부살이 하고 있는 충장공 류림의 전적비 측면에는 '영농한계선'이라는 글자가 깊게 새겨지는 등 훼손이 심해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역사가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남덕·오석기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