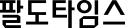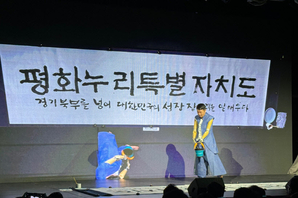경북 영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부석사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으로 유명한 고장이다. 이 곳 외에도 영주에는 사진찍기에 매우 훌륭한 이색 마을이 있다. 내성천 외나무다리로 유명한 무섬마을이다. 한겨울이 한창이지만 벌써 따뜻한 봄냄새가 느껴지는 무섬마을에 다녀왔다.
내성천과 서천 만나 섬 아닌 섬이 된 마을
통나무 쪼개 강에 얹은 외나무다리로 유명세
주민 삶과 함께하며 바깥 세상 이어주던 보물
고택 잘 보존된 한옥마을에선 오래된 정취
■유일한 교통수단 외나무다리
무섬마을은 소백산에서 흐르는 서천과 태백산에서 이어지는 내성천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물돌이 마을이다. 영주시청을 지나 영주시내 한가운데를 가로지른 서천은 문수면 끝자락에서 내성천을 만난다.
내성천 맞은편에 서면 무섬마을은 마치 물 위에 떠있는 섬처럼 보인다. 무섬이라면 섬이 아니라는 뜻인가. 알고보면 그게 아니다. 마을의 한자 이름은 수도리(水島里)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도’의 순우리말인 ‘물섬’으로 불렸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무섬’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콘크리트 다리가 생겼지만 30년 전만 해도 마을과 외부를 이어주던 유일한 통로는 외나무다리였다. 마을 주민들이 다른 지역과 소통하던 숨통이었던 셈이다.

이 다리를 건너 학생들은 학교에 다녔고, 외지로 시집가는 아낙네들은 꽃가마를 탔다. 평생 섬마을에 살다 눈을 감은 어르신들을 실은 꽃상여도 이 다리를 건너갔다. 애지중지 키워 다 큰 딸을 시집보낸 부모는 둑에 서서 꽃가마가 물에 떨어지지는 않을지, 아기의 시집살이가 고되지 않을지 걱정에 눈물을 삼켰을 것이다.
외나무다리는 절반으로 쪼갠 통나무를 하천 위에 얹어 만든 다리다. 통나무를 가로로 잘라 하천 바닥에 깊숙이 박은 게 교각이다. 하천이 그다지 깊지 않고 물살이 세지도 않아 이 정도만으로도 다리를 만들기에는 충분하다. 다리 덕분에 발을 젖지 않고도 하천을 건널 수 있다.
하천 둑은 무섬마을 둘레길로 조성됐다. 영주 시민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걷거나 혹은 자전거를 타고 둘레길을 오가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공기가 맑고 풍경이 깔끔해 산책하거나 조깅하기에 어울리는 코스인 모양이다. 자동차를 몰고 와 무섬마을 주차장에 세우고 둘레길을 걸어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다.
둑에서 강을 내려다보면 겨울 햇살에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특이하게도 강변에는 자갈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온통 모래뿐이다. 하늘에서 드론을 띄우고 살펴보면 오른쪽으로 굽은 초승달 모양의 모래사장이 마을을 삼면에서 둘러싸고 있다. 초승달 안쪽 부분에 마을은 잠든 듯 포근하게 숨어 있고 앞에는 나무가 우거진 숲이 마치 이불처럼 마을을 따뜻하게 덮고 있다. 내성천은 ‘C‘자 모양으로 굽어 마을을 널찍하게 흘러간다. 편안하게 쉬고 있는 마을을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방벽을 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무섬마을의 외나무다리는 두 개다. 이름이라고 해봐야 참 싱겁다. 외나무다리와 제2외나무다리다.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은 외나무다리다. ‘S’자 모양으로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진데다 제법 길어 걸어가는 재미가 있다. 평일 낮인데도 무섬마을에는 여행객이 적지 않다. 가족이나 연인이 대다수다.
외나무다리 한가운데에는 반 조각 통나무를 서너 개 덧붙여 너른 평상처럼 만든 대피공간이 있다. 이곳에 앉아 양말을 벗고 내성천 흐르는 물에 다리를 적실 수도 있다. 겨울인데도 햇살이 따스해 그다지 춥지 않은 덕에 평상에 앉아 포근한 햇볕의 온기와 은빛으로 졸졸 흐르는 하천 물소리를 즐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외나무다리는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올라가 걸어도 전혀 흔들리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다. 다리 곳곳에 교행이 가능하도록 쪼갠 통나무 한쪽을 덧붙여놓아 길이 막히는 일은 없다.
외나무다리는 모래사장에서 시작한다. 모래사장이 제법 넓기 때문에 걷다 보면 모래가 신발을 가득 채우기 십상이다. 걷기에 불편해서는 안 된다고 일부러 하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외나무다리를 시작하는 모양이다.
옛날에는 외나무다리 폭이 좁아서 장대를 잡고 건너야 했다. 지금은 다리의 통나무 폭이 30~40㎝ 정도여서 한 명이 걷기에는 충분하다. 높이도 불과 50㎝ 정도여서 어지간히 겁이 많거나 균형 감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면 별 어려움 없이 건널 수 있다. 대부분 방문객은 무섬마을 쪽에서 외나무다리를 건너가 마을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은 뒤 다시 다리를 건너온다.
겨울이어서인지 내성천을 흘러가는 물도 많지 않다. 그 덕분에 흐르는 물소리가 졸졸거리는 게 제법 귀엽고 정답게 들린다. 물이 많지 않고 깊지 않은 덕에 혹시 실수로 빠지더라도 발목까지 적시는 게 고작이다.
외나무다리 대피공간에 서서 연하게 귀를 스치는 바람을 느껴본다. 원래 마을에 바람이 드물게 부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 것인지 미미한 바람은 따뜻하게 느껴진다.

■조용하게 살기 좋은 한옥마을
반남박씨 박수가 병자호란 후 은둔하면서 선비의 삶을 살고자 1666년 이곳에 터를 잡음으로써 무섬마을이 생겼다. 이곳은 풍수지리적으로 전형적인 배산임수 형태여서 조용히 살기에는 매우 좋은 지형이다.
해방 전에는 100여 가구가 살았지만 1930년대 대홍수가 난데다 산업개발 시대에 많은 주민이 객지로 떠나는 바람에 한때 마을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2000년 대 들어 전통마을로 지정된 덕분에 겨우 살아남아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마을에는 기와 고택과 정자, 초가집 30여 채가 잘 보존돼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긴다. 고택은 아주 크거나 화려하지 않다. 소박하고 아담한 규모의 집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천천히 둘러보면서 옛 시골마을의 정취를 느껴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곳에는 경북 북부지역의 전형적인 양반집 구조인 ‘ㅁ’자 주택이 많으며, 초가집은 추운지방에서 많이 보이는 까치구멍 집 형태다. 고택의 나무 문틀이나 기둥의 짙은 갈색에서는 집의 숨은 내력과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느껴진다.
방안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대부분 고택은 둘러볼 수 있다. 지금은 50가구 정도가 살고 있어 빈 집도 적지 않다. 무섬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만죽재 고택 아궁이 옆에는 새까만 연탄 60여 장이 쌓여 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연탄가스가 새는 바람에 병원에 실려 간 기억이 새롭다. 벌써 40년이 다 돼 가는 시절의 추억이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연탄가스 중독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지 모르겠다.

짚을 새로 바꿔 끼운 듯 생생해 보이는 초가집 처마 아래에서 시래기가 잘 마르고 있다. 벌써 노래진 것도 있고 아직 파란 기운이 남은 것도 있다. 따끈따끈한 시래기국 한 사발이 그리운 순간이다.
초가집의 바깥으로 돌출된 아궁이 옆에 잘 마른 장작더미가 쌓여 있다. 아궁이는 어제 저녁에도 불을 지핀 것인지 시꺼먼 재가 잔뜩 묻어 있다. 겨울에 뜨끈뜨끈한 아궁이 앞 아랫목에 앉아 허리 아래에 이불을 덮고 굽거나 삶은 고구마를 먹던 시절은 이미 호랑이 담배 피던 때와 같은 옛날이 됐다.
초가집 벽에 ‘민박’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 이 마을에서는 고택과 초가집에서 민박하며 하룻밤을 보낼 수도 있다. 초가집 작은방의 들창으로 들어오는 은근한 장작 연기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날씨가 좋은 날 밤에는 하늘을 가득 채운 별이 쏟아지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다시 영주를 찾는 날 민박에 도전해야겠다.
글·사진=남태우 선임기자 le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