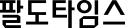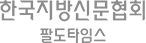타인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 그들에게도 그늘이 있다. 전문직종의 종사자이지만, '천사'라는 허울 좋은 이미지에 갇혀 낮은 보수와 법정 근로시간 초과 등 고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안전하지 못한 사업장 분위기로 마음과 몸이 상처를 입기 일쑤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초 (재)강원도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는 등 변화도 있었다. 하지만 일선 현장은 여전히 아우성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여파로 복지 수요가 대폭 늘어났지만 복지인력 충원 등 열악한 인프라 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강원일보는 현장에서 겪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과 실태,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분석, 시리즈로 싣는다.
24.6% "직장 안전하지 않다"…폭행 당해도 보상받을 길 없어
타직종 비해 대응체계·법적 근거 미흡 안전 담보 필요 목소리
전국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100만명에 달한다. 이 중 도내 소지자는 3만2,000여명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실제 도내 1,925개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는 2만4,914명에 불과하다. 8,000여명의 자격증 소지자가 과도한 업무와 낮은 보상체계로 인해 현장을 떠났거나 아예 현장에 진입조차 못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용자 폭력 등 잠재적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안전하지 못한 근무환경'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춘천의 한 장애인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A씨는 작업 치료 중 사례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사례자가 휘두른 주먹에 팔과 머리 등을 가격 당하면서 심각한 두통을 호소했지만, '병가'는 사용조차 못 했다. 심지어 상급자는 '늘상 있는 일'이라는 말에 치료도 '휴가'로 해결했다. A씨는 “기관 자체적으로도 '병가'라는 개념이 없다”면서 “아파도 쉴 수 있는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2018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중 24.6%가 '자신의 직장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도사회복지사협회가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도 사회복지사 5명 중 1명은 '직간접적인 신체적 위험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언어적 위험의 경우 직접 43.8%, 간접 41.8% 등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B씨는 “치매가 심한 사례자의 경우 개인의 실수로 다쳐도 보호자들의 질타가 이어지지만, 종사자는 사례자의 실수로 다쳐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사회복지사는 '다치는 것도 일'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인·경찰·소방관 등 전문직의 직업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법적 체계가 갖춰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대응체계와 법적 근거는 이들에 비해 미흡하다.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사의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열악한 직무 여건이 결국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하락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변영혜 도사회복지사협회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부재는 복지 서비스 위축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대처, 사후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수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