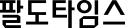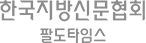“6·25전쟁에서 남한과 북한만 이념 대립을 한 게 아니라 중국도 국민당과 공산당으로 나눠져 대립을 했죠. 이데올로기의 비극과 상처가 제주섬 곳곳에 남아 있는 이곳은 역사의 산 교육장이 됐으면 합니다.”
김웅철 향토사학자(71)는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24일 대정현 역사자료전시관에 내걸린 중공군 포로 사진을 보여줬다.
포로들이 도열해 이국땅에서 숨진 동료의 시신에 청천백일기를 덮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담긴 귀중한 자료다.
김씨는 “중공군들은 모슬포~사계리 도로 개설과 모슬포성당 기초 공사에 동원됐으며 일부는 아일랜드 출신 설리반 군종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며 “채소를 즐겨먹으면서 농장대를 조직, 수용소 인근 밭에서 채소를 직접 재배했다”고 말했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은 6·25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해 조선을 돕는다) 전쟁이라고 부르며 연 인원 300만명의 중국인민지원군을 전장에 보냈다. 이 중 약 15만명이 전사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거제도 수용소에는 17만명이 넘는 북한국과 중공군 포로들이 수용됐다.
거제도에서 친공(親共) 대 반공(反共) 포로 간 학살과 잔학행위가 발생하자 미군은 분산 수용을 결정하고 1952년 8월 모슬포와 제주시에 중공군 포로수용소를 설치했다.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 1만4314명은 모슬포로, 친공포로 5809명은 제주시 용담동 닦그네마을에 설치된 수용소에 수감됐다.
제주시 수용소 내 친공포로들은 1952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3주년을 맞아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시위를 벌였다.
미군 2개 소대가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포로 56명이 죽고, 113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런 와중에도 중공군 포로들은 ‘자치대’를 조직해 북을 치며 나팔을 불며 군대식 열병을 했다. 이들은 또 양철 조각으로 만든 피리를 불며 애환을 달랬다.
대만 정부는 모슬포에 있는 반공포로들을 위로하기 위해 설탕과 바나나, 파인애플, 소고기 통조림 등 27t의 물품을 대형 수송기에 실어 보냈다.
1951년 1월 모슬포에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되면서 직할병원으로 제98육군병원이 들어선 가운데 의료진들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중공군 부상병들을 치료해줬다.
“포로수용소 건물은 나지막했고, 검은 타르로 칠한 지붕 아래에서 포로병들이 생활했다. 여름에는 실내가 뜨거워서 나무판자로 물레방아 같은 선풍기를 만들어 포로병들이 교대로 줄을 당기며 바람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미군 부대 출입 이발사 서병수씨의 중공군 포로수용소 목격담·대정읍지 발췌)
1953년 6월 포로교환협정이 체결된 이후 송환을 거부했던 모슬포에 수용된 1만4000여 명의 반공포로는 미군 함정에 승선해 대만으로 갔다. 수용된 지 1년 만이었다.
제주읍에 있던 친공포로 5000여 명은 모슬포항에서 인천항까지 배로 수송된 후 육로를 통해 북한을 거쳐 중국으로 귀향했다.
김웅철 사학자는 “중공군 포로수용수의 본소와 2개 분소는 모슬포에, 나머지 1개 분소는 현 제주국제공항 화물청사 인근에 있었다”며 “포로 수용을 위해 민가가 철거되고 토지가 강제 징발되는 등 이 지역 주민들이 적잖은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대정읍 상모리에는 중공군 포로들이 머물던 수용소 건물 외벽이 남아 있다. 길이 20m, 높이 2m의 석축 벽에는 창틀 모양을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은 마늘밭으로 개간돼 밭 돌담으로 이용되면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