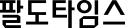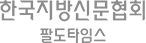30대의 중도 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박달옥(62) 씨의 별명은 '땡순이'다. 아들이 주간보호센터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딱 맞춰 귀가하는 일상 탓이다.
대화조차 안 되는 박 씨의 아들은 주간보호센터 외에는 갈 곳이 없다. 박 씨는 "주간보호센터를 다니던 초기에는 소리를 지르고 창문 유리를 깨기도 했다"면서 "우리 애처럼 자폐가 심하면 갈 곳이 마땅치않다"고 하소연했다.
박 씨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그는 "어렸을 땐 우리 아이도 특출난 면이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했다"면서도 "드라마와 다르게 성인이 되니 힘에 부쳐 야외에 데려가는 것도 힘들다. 낮에는 주간보호센터에, 밤에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대부분"이라고 했다.
최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다룬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폐 장애 가정이 처한 현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대구에도 1천400여명의 자폐성 장애인과 가족들이 평범한 일상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드라마와는 달리 현실에선 자폐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취업의 벽이 높고 가족들의 부담이 크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대구에 등록된 자폐성 장애인은 1천468명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의 1.2%를 차지한다. 자폐성 장애인은 개인마다 증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일컬으며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를 통틀어 '발달 장애인'으로 분류된다.
드라마 속 '우영우 변호사'처럼 고기능 자폐에 속하는 아스퍼거 증후군, 서번트 증후군도 있지만 현실에선 극히 드물다.
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폐'가 장애 유형 중에서도 사회 적응이 가장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대화가 가능한 경도 자폐성 장애의 경우 학교 및 직장 생활은 가능하지만 그 비율이 대단히 낮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표한 '2021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20만9천497명 중 일하는 발달장애인은 임금, 비임금을 모두 포함해도 29.3% 수준이다.
중도 자폐성 장애인은 일상생활 폭이 더욱 좁다.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발달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최중도 자폐성 장애인은 가족들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나호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지역사회의 이해와 인식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며 "개인별 자폐 증상에 맞는 환경을 제공해주면 발달장애인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