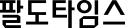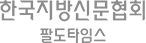서슬 퍼런 유신시대(維新時代). 그 때는 참 안 되는 게 많았다. 지켜야 하는 것도 꽤 많았다. 국가가 정해 놓은 규칙을 어길라치면 개인에게는 추상같은 벌칙이 기다리고 있던 시절이다. 이제 와서 뒤돌아보면 흑백사진 속 아련한 추억의 한 장면처럼 보이겠지만 그 주체가 국가라는 점을 놓고 보면 꽤나 좀스럽고 쩨쩨한 일들의 향연이었다. 노스텔지어(Nostalgia)와는 애시당초 거리가 먼 일들이었다. 그 중심에는 국민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위정자들의 어리석음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오히려 '저항'의 불씨를 당기는 역할을 했다.
서슬 퍼런 유신시대,
공공질서 확립 이유로 통제
야간 통행금지로 발 묶고
막차 놓치면 경찰서 유치장행
젊은이들 자유를 옭아맨
미니스커트·장발 단속도
거리질서 어겼다고 체포까지
1970년대 당시 존재했던 대표적인 국가의 간섭 몇 가지를 살펴보자.
먼저 우리에겐 '야간 통행금지'가 있었다. 보통 '통금'이라고 불렀던 이 야간 통행금지가 폐지된 것은 1982년 1월의 일이다. 그나마 휴전선과 인접한 강원도 내 일부 지역은 서울올림픽이 열린 해인 1988년이 돼서야 족쇄를 풀 수 있었다.
야간 통행금지 제도는 1945년 광복과 6·25전쟁을 거치는 동안 국민들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에 우리 사회에 안착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 권력자들에게는 사회 공공질서 유지와 질서 확립이라는 미명 아래 통제와 감시의 수단으로 활용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 제도 때문에 막차를 놓친 많은 선량(?)한 사람이 경찰서 유치장 경험을 하기도 했다.
미니스커트와 장발 단속도 빼놓을 수 없다. 단속을 시행하면서 내놓은 이유는 '미풍양속 보호'다. '미풍양속'의 사전적 의미는 '아름답고 좋은 풍속'이다. 긴머리, 짧은 치마는 '아름답지 않고 좋지도 않은 풍속'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꼴보기 싫다는거다. 당시 멋 좀 부리려던 장발의 젊은이들은 경찰들 손에 쥔 바리캉에, 또 가위에 머리가 여지없이 집혀 나갔고, 치마 입은 아가씨들은 길거리에 불러 세워져 무릎부터 치마 끝까지의 길이를 인증해야만 했다. 20㎝를 넘으면 경범죄로 처벌을 받아야 했다.
권력은 거리질서를 지키는 일에도 병적인 집착을 보인다.
사진①은 1976년 3월의 어느 날, 한 무리의 남녀 젊은이들이 검은 호송차에 오르기 전 차량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다. 무슨 엄청난 죄라도 지었는지 얼굴은 찍히지 않으려고 카메라 앵글을 등지고 서 있다. 호송차에는 자그마한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거리질서 위반자 단속차량'이라고 쓰여 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거리질서를 어떻게 어겼길래 이렇게 체포까지 됐을까.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라도 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라도 친 사람들인가. 이런저런 추측을 해 보지만 이들의 저지른 잘못은 고작해야 차선 위반이나 신호 위반, 무단횡단 따위다.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단지 그 이유만으로 이들은 경찰서 보호실(유치장·사진②)로 바로 붙들려 가 처벌을 기다려야 했다.
이 일은 지금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치안본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다. '도시 새마을사업'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범국민적 '거리질서 확립운동'을 펼친 것이다. △바로가고 바로서고 바로걷기 운동 △깨끗하고 시원한 거리 만들기 운동 △남에게 폐끼치지 않기 운동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캠페인 정도 수준으로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살벌하기 그지없다. 각 시·도경찰국별로 가두질서정화지휘본부를 설치해 특권층이나 신분 여하를 불문하고 가두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적발 즉시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것이 당시 치안본부가 내린 지시 내용이다. 특히 훈방을 지양하고 전원 형사입건 또는 즉심회부를 원칙으로 한다는 또 다른 조건까지 걸어 놓았으니 상식은 온데간데없는 '야만의 시대'그 자체였다.
1970년대를 벗어나고 1980년대 그 이후까지도 '계몽'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진행한 거리질서 위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은 오랜 기간 이어졌다. 그리고 그 내용은 꽤나 빈번하게 방송이나 신문지상을 채우는 소재가 됐다.
오석기·김남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