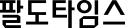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입문 과정이 ‘대필 자서전-출판기념회’ 패키지(2월6일자 1면 보도)로 성황인 가운데, 이렇게 제작된 책들이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을 받아 공공 장서 납본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른바 ‘딸깍 출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현행 방식이 현실과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9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따르면, ISBN은 출판사가 일정한 등록 절차를 거쳐 발행자번호를 신청하고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도서번호를 신청하면 발급된다. 이후 ISBN을 받은 도서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자료에 해당하면 30일 이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판매용 자료의 경우 1부에 대해 정가에 부합하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납본 물량이 늘면 전체 보상금으로 지출되는 예산 규모도 함께 커진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전자책 납본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지난 2016년 1천213만원에서 2021년 2억3천492만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억6천276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성형 AI 확산 이후 전자책 제작이 쉬워진 환경과 맞물린 흐름으로 풀이되는데,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자서전 등 종이책까지 더해질 경우 납본 신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ISBN 발급과 납본은 출판 실무 영역에 가까운 사안이었지만, 생성형 AI로 전자책을 대량 발간한 A출판사 사례가 알려지면서 화두로 떠올랐다. A출판사는 1년간 9천여 권의 책을 AI로 제작한 뒤 이중 5%를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책 납본 시스템에 신청했다. 이를 계기로 ‘AI로 대량 생산된 출판물도 납본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 것이다.
A출판사 측은 납본 제도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하는 한편, 현실에 맞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ISBN 발급 건수가 평균 이상인 출판사를 중심으로 납본 대상 여부를 더 엄격히 검토하고 있다. 다만 AI 활용 여부 등을 가릴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발행 건수나 신청 시점 등 정황을 참고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어 한계가 뚜렷하다.
김태선 문학평론가는 “윤리적·법적 가이드가 정비되지 않으면서 아노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I가 쓴 것인지 사람이 쓴 것인지 판단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보는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같은 발행인이 여러 출판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현행 모니터링 방식으로는 걸러낼 수 없다”며 “정교하게 작성된 AI 저작물의 경우 전문가의 눈도 속일 수 있는 만큼, 무엇을 ‘AI 저작물’로 볼 것인지부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