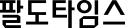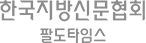“바지락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바닷물이 뜨거워져서 그렇죠.”
지난 1일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어촌에서 만난 김호연 백미리 어촌계장은 줄어든 어획량으로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백미리는 갯벌에서 나오는 바지락으로 유명한 곳이다. 과거엔 1명이 수백㎏을 채취하는 호사를 누렸지만, 지금은 옛말이 됐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따르면 경기도 바지락 생산량은 2000년대 초 6천500t에 달했지만 지난해 757t으로 87%나 줄었다. 연구소는 바지락 어획량 감소의 원인으로 서식지 감소, 퇴적물 증가 그리고 서해 수온 상승을 꼽았다. 수온이 높아지며 폐사 발생 가능성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것이다.
줄어든 바지락 생산은 판매 실적 감소로 이어졌다. 경기수협 집계 결과, 궁평항사업소의 2023년 패류 위판실적은 24억3천900여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4억9천700여만원으로 1년 만에 9억여원이나 줄었다.
경기수협 관계자는 “바지락 등 어패류는 표면에서 보통 2~3㎝ 밑에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직격탄을 맞아 폐사할 수밖에 없다”며 “80~90%가 폐사되다 보니 판매량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는 현상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다. 기상청의 ‘2024 연 기후특성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반도 연근해의 평균 해수면 온도는 18.6도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고, 경기도와 맞닿아 있는 서해의 경우 지난해 연평균 해수면온도는 16.5도로 2023년 14.5도 보다 2도나 올랐다. 이런 추세라면 서해는 계속 뜨거워질 것이 확실하다.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바지락 생산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바지락 인공종자 대량생산을 비롯해 시험 방류 및 생존율 조사, 갯벌 패류 종자 채집 기술개발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바다가 날로 뜨거워진 현상은 비단 바지락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정확한 실태 조사와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 계장은 “최소한 용역을 통해 무슨 조개가 들어오고 뭐가 폐사하는지 등 화성 앞바다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맨손 어업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낙지를 잡는 것인데 지금은 생산량이 10분의 1로 줄었다. 그게 현실”이라며 “어민들의 생계가 달려있는데, 지금은 여기서 생계를 이어갈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