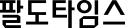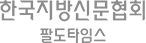“갑자기 불어난 물에 사람들이 순식간에 휩쓸렸다. 태풍 때도 이렇게 산이 한순간에 무너지진 않았다.”
최근 수해를 당한 산청 이재민들은 극한호우와 산사태의 공포를 떠올리며 말문이 막혔다. 산청에서만 인명피해가 19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그 위력을 실감케 한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산청에선 지난 19일부터 20일 오전 사이 산사태와 주택 붕괴·유실, 급류 휩쓸림 등으로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1명이 실종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 17일부터 내린 비로 토양 포화
19일 시간당 최대 90㎜ 쏟아지자
산사태·급류 휩쓸림 순식간에 발생
군, 사상자 발생 이후 대피령 발송
강제성 없어 대피도 일부에 그쳐
13명 사망·1명 실종·5명 중상 피해
산청 195곳 등 도내 산사태 취약지
주민에 공개 않아 위험 인식 낮아
지정 관리·대책 사실상 ‘무용지물’

주민들은 급류가 마을을 휩쓸고, 산사태가 발생한 뒤 대처하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신등면 율현리 한 주민은 “산 위에서 아래로 계곡을 따라 물살이 워낙 강하게 내려와 대피가 어려웠다”고 했다.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산사태를 목격한 주민은 “산 경사를 따라 큼지막한 바위와 돌무더기가 굴러내린 지역 주민은 미처 대피하지 못했다. 산사태가 발생한 곳에 주민을 구하러 갔다가 곳곳에서 ‘쾅쾅’하며 돌무더기가 쏟아지는 것을 피하느라 혼비백산했다. 겨우 내 목숨만 건졌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을 겪은 시천면 등 주변도 산사태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산청읍과 인근 부리, 내리마을 등 산자락에 걸친 마을에서 인명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산청군은 19일 오후 1시 38분 전 군민 대피령을 발령했지만 이미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였다. 여기에 행정당국이 주민 대피를 내렸더라도 강제성이 없는 탓에 실제 대피한 주민은 일부에 그쳐 향후 재난 대비 과제로 남는다.
산사태는 주로 비가 많이 오면 땅속으로 침투한 빗물을 담을 수 있는 흙 속의 공간에 물이 차게 되고, 암반 위의 물을 머금은 무거운 흙의 마찰력은 낮아져 비탈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현상에 의해 발생한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강우량이다. 적은 강우도 장시간 내리는 경우, 단시간 폭우가 내리는 경우 모두 산사태 원인으로 작용한다. 간접 원인은 산불 피해나 산지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산림청은 최대시간 강우량 30㎜, 일강우량 100㎜, 연속강우량 200㎜ 이상일 때 산사태 위험이 크다고 본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비는 더욱 강하게, 많은 양을 뿌리면서 역대 강우량을 경신하는 빈도는 잦아지고 있다. 또 산지 개발 사례가 늘고 있어 향후 산사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지난 16~19일 산청 시천면 798㎜, 산청읍 717㎜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19일 산청 시천면에는 1시간 동안 98.5㎜의 극한호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박재현 경상국립대 산림자원학과 교수는 “산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들은 7~9부 능선 요지(凹地)에 해당했으며, 우리나라 산지 평균 경사도가 25도 정도인데 반해 45도 정도까지 모두 가팔랐다”며 “17일부터 많은 비가 내려 땅속에 스며든 빗물로 토양이 포화된 상태에서 19일 시간당 최대 90㎜가 넘는 극한호우가 내린 것이 트리거(계기)가 됐다고 보인다. 극한호우와 지형적 위치, 지질적 요인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진단했다. 이어 “산각지 계곡 부근에 주택지를 조성하는 등 원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해 피해가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내에선 대형 산사태 재난을 겪은 아픔이 있다. 특히 산청은 산사태 위험이 크지만 실제 인식은 낮은 편이다. 2002년 태풍 루사 때 산사태로 35명이 숨졌다.
지난해 말 기준 경남엔 모두 2514곳의 산사태 취약 지역이 있다. 이 가운데 산청군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195곳으로 집계됐다. 산지가 많은 경남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한 해 평균 22㏊ 정도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다. 한 해 평균 축구장(0.714㏊) 면적 30개 넘는 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2015·2017·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산사태가 발생했다. 그중 2020년 산사태는 102㏊로 피해가 컸다.
정부와 지자체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등에게 시설, 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험을 알리는 표지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경남도를 비롯해 지자체별로 산사태취약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자체 관리하고 있다. 이는 땅값 하락을 우려하는 토지주 등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사태취약지역 일대 주민들은 지정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위험에 대한 심각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관리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남기훈 창신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산청에 비가 많이 내린 점도 있겠지만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무엇보다 대피가 늦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산사태나 급류는 발생한 이후 대피가 어렵다”며 “지자체에서 위험성에 따라 사전에 대피시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게 문제다. 대피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