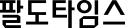산청에 막대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 일주일여 지났지만 산사태 등 피해가 막심했던 일부 마을은 여전히 황폐화 상태다. 주민들은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복구에 한숨이 깊다.

27일 산청군에서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던 일부 신등면 율현리와 산청읍 부리마을 일대. 주변을 오가는 도로 곳곳은 아직 돌무더기와 진흙을 다 치우지 못한 채 널려있다. 다행히 통행은 가능해 포클레인과 덤프트럭, 살수차량 등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오갔다. 산자락에 위치한 마을, 돌무더기가 쏟아진 곳에 있던 주택은 떠밀려 내려가 사라졌고, 불어난 물이 덮치고 간 주택은 골조가 무너져 내리거나 주택 내부가 진흙에 완전히 잠겨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됐다. 율현리에서 피해가 컸던 주택 주민들은 마을회관 등에서 겨우 숙식을 때우며, 망가진 집을 떠나지 못한 채 주변을 정리하고 있다.
이날 오전 신등면 율현리 한복심(79)씨 주택은 호우피해 복구작업에 동원된 포클레인 1대와 덤프트럭 1대가 마당에 쌓인 흙더미를 치우고 있었다. 집기를 정리하던 한씨는 “하루아침에 이 꼴이 되어 어디 살 수가 있겠나. 정신이 하나도 없다”며 “남편과 마을회관에서 잠을 자고 있다. 당분간만이라도 좀 편한 데서 잘 수 있으면 좋겠다. 언제쯤 복구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또 마을 주민 정무용(68)씨는 “집을 뜯어서 새로 지어야 한다고 한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봉사단체에서 나와서 도와줄 사람도 없어 타지에서 생활하는 형제들과 자녀들이 모두 도우러 왔다”며 “쓸만한 게 남아 있는지 모두 꺼내 봐야 알 수 있으니 정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씨는 “복구는 기약이 없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늘막 등 무너져내린 일부 시설은 다 보상이 안 된다고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막막한 심정”이라고 했다.
부리마을에서 종봉장을 운영하는 정기호(61)씨는 “살아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라고 하지만, 전 재산이 다 날아갔다. 벌통 600통 모두 폐사하게 됐다”며 “전부 뻘이 들어가고 떠내려가서 1000만마리 넘는 벌이 모두 죽게 생겼다. 살아 있는 생명이라 마음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원 봉사자들이 벌에 쏘일까 봐 도움을 못 받고 혼자 감당하고 있다.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인근 주민 김필수(56)씨는 “오늘 아침 주변을 둘러봤는데 전체적으로 아직 엉망이다. 날이 더워지면서 떠내려온 음식물들이 악취도 나서 집 주변을 정리했다. 화요일에 군부대에서 나와 도와주기로 해 많이 복구가 될 것 같다”며 “산청군에서도 군데군데 방역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산청군 전역에 여기저기 할 것 없이 피해가 어마어마했지 않느냐”고 했다.